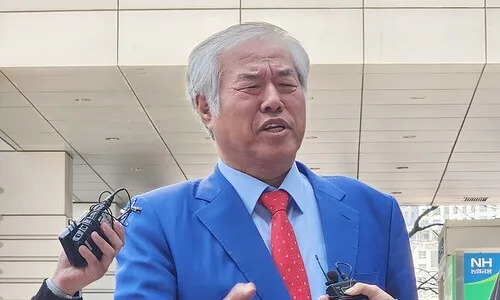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시리아 파병 미군의 전면 철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지상군을 파견한 이후 3년여 만의 철군이다. 현재 미군은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2천여 병력을 파병해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와 싸우는 현지 반군세력 ‘시리아민주군’(SDF)을 지원해왔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핵심 외교·안보 참모들의 반대를 누르고 이뤄졌다고 한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이 결정에 항의해 곧바로 사의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마저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세계의 경찰’ 구실을 포기하고 오직 경제적 관점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한-미 동맹을 한반도 안정의 축으로 삼고 있는 우리로선 트럼프식 고립주의가 동북아에 어떤 파장을 끼칠지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시리아에서의 갑작스러운 미군 철수로 미국-러시아 간, 정부군과 반군 간 팽팽하던 힘의 균형이 무너져 중동 정세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그럼에도 미군의 시리아 철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고립주의’ 본격화는 우리에겐 꼭 불리한 쪽으로 작용하리라 단정하긴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남북 간 군비통제 노력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당장은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는 트럼프 행정부 태도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국 정부가 미국 외교의 변화 흐름을 잘 읽고 대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중동에서의 미군 철수가 곧바로 동북아 주한미군의 재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입장에선 북-미 비핵화 협상이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에 새 변수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가시화할수록, 주한미군의 지위 문제 논의를 무조건 금기시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분위기가 마냥 지속되긴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전시작전권 전환, 한-미 간 연합훈련, 방위비 분담금 조정 문제 등에서 훨씬 세심하고 전향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단독] “잠결에 했을 수도” “한부모라”…함상훈의 아동성범죄 감형 사유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5/183/imgdb/child/2025/0413/53_17445077781892_20250409503377.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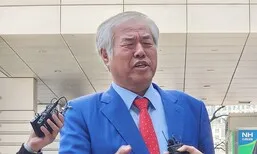
















![[포토] “의선이형, 그린철강에 투자하세요”](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11/53_17443356481814_20250411501176.webp)

![기후위기에도 감세 정책만 내놓는 대선 잠룡들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02/53_17435897402671_20250402503665.webp)







![검찰독재정권 2022.05.10~2025.04.04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04/53_17437558978226_20250404503237.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잠결에 했을 수도” “한부모라”…함상훈의 아동성범죄 감형 사유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13/53_17445115513887_20250408503854.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