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자동차그룹인 폴크스바겐이 한국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다. 환경부는 2일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위조’를 이유로 폴크스바겐 32개 차종 8만3천대에 대해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인증이 취소되면 자동으로 판매도 중단된다. 앞서 인증 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까지 포함하면 폴크스바겐 차량의 70%가 판매 금지 목록에 올랐다.

환경부의 이번 조처는 폴크스바겐이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다. 폴크스바겐은 지난 6월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 47만명에게 약 17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에서도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1년이 다 되도록 배상은커녕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며 발뺌만 일삼았다. 폴크스바겐의 이런 뻔뻔한 태도는 한국 소비자들의 분노를 키웠다. 폴크스바겐은 환경부의 인증 취소 처분 직후 “깊이 사과드리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말로만 말고 리콜 등 제대로 된 피해배상안을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내놔야 한다. 그래야 사과가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
폴크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제도다.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을 막고 다른 기업들이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자는 취지다.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순순히 책임을 인정하고 17조원 규모의 배상안을 내놓은 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무서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우리나라는 현재 하도급거래 등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한계를 보완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는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제2의 폴크스바겐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입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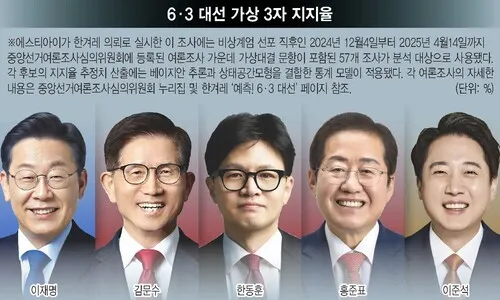
![<font color="#FF4000">[단독]</font> ‘MBC 자회사 주식’ 이진숙, 이해충돌 심사 중에 재허가 관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16/53_17447824908067_20250416502368.webp)







![[사설] 한덕수 ‘월권 지명’ 효력정지, 당장 철회하고 사죄해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16/53_17448025888514_20250416503888.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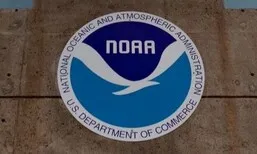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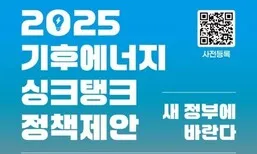


![[단독] 홍준표 쪽-명태균 1억원 돈거래 정황…“김영선 선거비용 5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15/53_17446987298565_20250415502731.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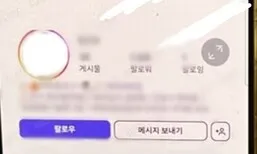




![검찰독재정권 2022.05.10~2025.04.04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04/53_17437558978226_20250404503237.webp)


![<font color="#00b8b1">[뉴스 다이브]</font> 검찰개혁 밑그림 밝힌 이재명과 ‘반명’만 외치는 국힘 주자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16/53_17447841587991_20250416502555.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한강 작가 새 책, 다음주 나온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17/53_17448157350947_20250416504087.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