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대화’를 했다. 취임 뒤 몇 차례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다가 여기저기서 소통의 빈곤이 지적되자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한가위를 앞두고 대이동이 시작되는 만큼 추석 민심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자 대화 멍석을 깐 것이다.
하지만, 대화가 성립되려면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의도의 진정성과 내용의 신뢰성이다.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대화로 포장된 행사는 일방통행식 설교로 끝나기 마련이다. 막힌 곳을 뚫기는커녕 불신과 냉소주의를 부채질하는 역효과만 자아낸다.
무엇보다도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은 공안기관의 전면 등장이다. 촛불집회 적극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추적·압수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고 검찰이 총동원돼 ‘사정작업’이 벌어진다. 부패나 비리혐의가 있을 때 수사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은 그 힘을 가려서 써야 한다. 예전에 선거철이 되면 정치권에서 상대방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럴 때면 검찰에서는 정치권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온갖 것을 들고 온다고 푸념하곤 했다. 검찰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일일이 판가름을 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면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하건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검찰의 전반적인 신뢰 기반 붕괴로 이어진다.
검찰이 주도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결코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공정한 법집행기관이라는 신뢰를 스스로 확립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칼을 뺄 때와 아닐 때를 현명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쇠고기 수입 파동 보도는 검찰이 나설 일이 아니다. 내용이나 형식에서 지나친 점이 있으면 언론 스스로 해결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맞다. 검찰의 의도를 의심케 하는 또 하나의 대목은 ‘죽은 권력기관’의 비리혐의는 샅샅이 뒤지고 ‘살아 있는’ 권력기관의 혐의는 뭉그적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사돈이 이끄는 대기업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요즈음의 사정태풍에서도 들리는 얘기가 없다.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의 제동장치를 풀어주자는 발상이 공공연히 논의되는 것도 대화 터전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다. 이미 사문서가 된 듯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국정원 진실위는 지난해 10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방대한 보고서와 함께 국정원 발전을 위한 권고와 제언을 발표했다. △국정원과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과거에 행한 월권적 행위에 대한 유감 표시 △정치 불개입 원칙 고수 △공권력 남용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 회복과 구제 절차 마련 △교류와 협력시대에 걸맞은 정보 수집체계 구축과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권고와 제안에 국정원이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기 국회 개막과 함께 드러난 것은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다.
기막힌 것은 국정원 권한 강화 필요성의 근거로 거론되는 것이 촛불 정국에서 국정원의 역할이 없었다는 인식이다. 아니 촛불 정국에서 국정원이 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사건, 수지 김 간첩조작 사건 등 수많은 의혹 사건의 기억이 생생한데 온 국민을 상대로 사찰을 하라는 것인가? 위압과 소통은 결코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김효순 대기자hyoskim@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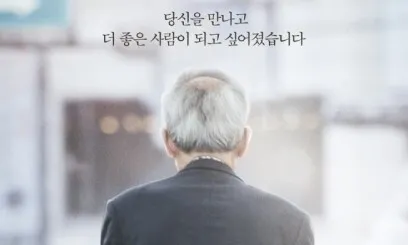















![[단독] “창원산단, 윤석열 정부 히든카드” 명태균, 김건희에 보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09/53_17441505688636_20250408504183.webp)
![기후위기에도 감세 정책만 내놓는 대선 잠룡들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02/53_17435897402671_20250402503665.webp)

![한국 유일 \'여성 빙하학자\' …자연이 묻어둔 \'냉동 타임캡슐\'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328/53_17431240933742_20250327504802.webp)







![[단독] 교제폭력 피해자가 살인자로…31번 신고에도 보호받지 못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04/53_17437212560116_20250403504325.webp)




![<font color="#FF4000">[속보]</font> 미국, 한국 25% 등 상호관세 발효…중국엔 104%](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582/imgdb/child/2025/0409/53_17441721548842_20250409501837.webp)
![<font color="#00b8b1">[뉴스 다이브]</font> 명태균의 ‘김건희 보고서’ 입수...윤석열 부부 구속 신호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5/0409/2025040950261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