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5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김창오(64)씨는 12살이던 1967년 화장실에서 자신의 ‘한국인’ 정체성에 대해 공포를 느꼈던 그 순간을 아직 잊지 못한다. 당시 지하철역 화장실에는 “조선놈 돌아가라”는 낙서가 여기저기 쓰여 있었다. 일본 사회의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를 온몸으로 느낀 순간이었다. “낙서를 봤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사람이라곤 부모님밖에 모르는데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김씨는 이후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녔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한 1974년, 도쿄에 판다를 보러 가자는 친한 형의 손에 이끌려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는 한민통 재일동포들의 모습에 충격과 감동을 받고, 단체에 가입하게 됐다. 김씨는 이후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더는 숨기지 않았다. 한민통에서 매주 수요일 한국어를 배웠고 매주 금요일 한국사를 공부했다. 처음으로 잔혹한 일제 식민지배에 대해 알게 됐고, 독립운동 역사를 공부했다. 특히 1960년 4·19혁명을 이끌었던 학생들 이야기를 배우면서 김씨는 한국의 민주화와 조국 통일을 위해 한평생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다고 한다.
1973년 결성된 한민통에 암운이 드리워진 건 박정희 정권의 공안 통치 때문이다. 1977년 한민통이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당시 간첩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정사씨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지정됐다. 박정희 정권은 150여명의 재일동포 유학생을 간첩으로 만들고 고문, 사형,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해 감옥에 가뒀다. 전두환 정권 때도 암흑기는 이어졌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민통 의장 경력을 이유로 반국가단체 수괴죄를 적용받아 사형을 선고받았다. 간첩으로 몰렸던 김정사씨는 2013년 5월에 이르러서야 대법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한민통의 후신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여전히 반국가단체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2003년까지 김씨가 한통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여권을 내어 주지 않았다. 김씨는 1992년 통일운동을 위해 독일 베를린으로 출장 갔을 당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독일 경관들에게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끌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일본에서 발급한 ‘재입국허가증’은 김씨를 보호해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김씨는 한국 여권을 발급받고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언제가 될지 몰랐던 “서울에서 보자”는 약속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 아침, 김씨는 일본에서 겪은 수모와 차별, 그동안 고국에 가지 못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하염없이 울었다. 그렇게 48년 생애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김씨 손에는 대한민국 ‘임시 여권’이 들려있었다. 김씨는 다음 해인 2004년이 돼서야 정식 대한민국 여권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다행히 김씨는 2004년 한국 정식 여권을 발급받은 뒤부터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왕래에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김씨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여전히 다수의 한통련 회원이 일본에 발이 묶여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태다. 한통련 회원 가운데 21명은 1∼5년의 짧은 유효 기간의 여권밖에 발급받을 수 없어 기간이 끝날 때마다 갱신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발족식에 김씨만 참석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이날 이창복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와 최병모 전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상임대표 등 29명은 아직 한통련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어 이 단체 회원이라는 이유로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일 한국인들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해 대책위를 꾸렸다고 밝혔다. 최병모 대책위 대표는 “한통련이 지금 받는 탄압은 일본에서 한국의 독재정권에 반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점 오로지 하나 때문”이라며 “한통련 회원들은 모두 자유로운 한국인이므로 한국에 드나드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임종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여권은 사실상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라며 “아무리 험악한 범죄를 저질로도 주민등록증은 내준다”고 지적했다.
발족식 현장에서 나온 설명을 종합하면, 한통련 회원이자 김씨의 한 선배는 여권을 제때 발급받지 못해 어머니의 임종을 함께하지 못했다. 손형근 한통련 의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권을 신청했지만, 여권이 나오지 않아 여전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본에 발이 묶인 한통련 회원들은 재입국허가증을 가지고 일본에서 나온 뒤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장기간 국외연수나 유학을 가는 건 불가능하다. 김씨가 15년 전 간신히 극복한 고통을 한통련 회원 중 일부는 아직도 감내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에 “한통련 회원들에게 여권을 발급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청와대 등에 진정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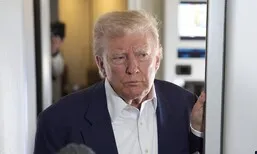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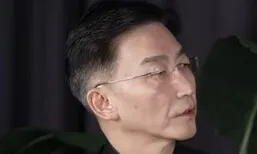






![[사설]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은 재수사하면서 ‘명품백’은 왜 안하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25/53_17455734859596_20250425502758.webp)

![광장의 함성 뒤, 다시 꺼내 읽는 ‘세월호, 그날의 기록’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19/53_17450371823828_20250417504337.webp)












![<font color="#FF4000">[속보]</font> 강원 인제 산불 이틀만에 진화 완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27/53_17457124520224_20250427500314.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