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당시 소매점의 97%는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됐다. 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당시 ‘바닥면적이 300㎡(약 90평) 이상인 소매점에 한해 경사로 등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사실상 편의점 등 대부분의 소매점을 이용할 수 없었고, 장애인들은 2018년 4월 ‘해당 시행령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다’며 국가가 위법적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오후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대법정 100석 좌석은 절반 이상이 방청객으로 가득 찼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10명가량 참석했다.
참고인 발언에 나선 지체장애인 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는 “최근 지인을 만나 카페를 가려고 했지만 (장애인 접근 시설이 있는 카페를) 1시간 동안 못 찾아 결국 길에서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물을 사려고 해도 편의점을 못 가고, 머리를 깎고 싶어도 이용원을 못간다. 여권사진 찍으려고 사진관을 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어서 여권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제가 찍었다”며 “휠체어 사용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소매점을 이용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원고 쪽은 위법·위헌적 규정을 개선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주장했다. 원고 쪽 변호인은 “시행령이 만들어진 1998년 이후부터 (2022년 4월 개정 전까지) 20여년간 경사로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 편의점은 0.1~5% 남짓이었다”며 “이 시행령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오히려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쪽은 소매점은 대체수단이 많은 만큼 시행령으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소매점 대신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다. 편의시설이 상당히 갖춰진 대형마트 이용도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직접 소매점을 방문하되 활동보조사를 통해 대신 구매할 수도 있다”며 “(장애 유형의) 다양성 관점에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소매점 이용권은 (보장에) 한계가 있는 권리”라고도 말했다.
양쪽 대리인의 발언이 끝나자 대법관들의 질책 섞인 질문이 이어졌다. 오경미 대법관은 “20여년간 이런 상태가 유지됐다는 건, (장애인들이) 그 장소에 갈 수 있어도 들어갈 수는 없었다는 뜻 아니냐. 그걸 쉽게 대체되는 권리라고 말하는데 놀랐다”며 “온라인 주문으로 대체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면서 온라인 (활동을) 하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전체 매장의) 5%로도 안 정해놓고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우리가 할 바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건 도저히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닌가”라고 피고 쪽에 물었다.
앞서 1·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법원은 소매점 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이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보아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그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국가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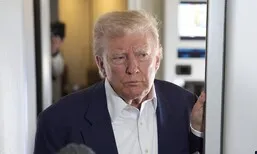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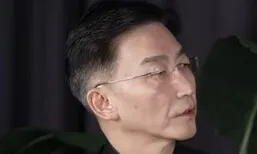






![[사설]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은 재수사하면서 ‘명품백’은 왜 안하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25/53_17455734859596_20250425502758.webp)

![광장의 함성 뒤, 다시 꺼내 읽는 ‘세월호, 그날의 기록’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19/53_17450371823828_20250417504337.webp)











![<font color="#FF4000">[속보]</font> 강원 인제 산불 이틀만에 진화 완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27/53_17457124520224_20250427500314.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