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 미국 가주한미포럼 김현정 사무국장

22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심부인 세인트메리스 스퀘어파크에서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이 열린다. 미국 내 7번째 기림비이며 대도시에 세워지는 첫 기림비다.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마이크 혼다 전 의원 등이 참석하는 이 행사를 누구보다 감격스럽게 맞는 이가 있다. 바로 김현정(48) 가주한미포럼 사무국장이다.
기림비 설립은 중국계 판사인 릴리언 싱과 줄리 탕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20개 다인종 단체 연합체인 위안부정의연대(CWJC)가 주도했다. 김 국장은 이 단체의 집행위원으로서 전략과 언론 홍보를 담당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북부 글렌데일시에 살고 있는 그는 19일 제막식 준비를 위해 머물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의 전화를 받았다.
“2015년 9월 기림비 설립 결의안이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를 통과한 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에 30번쯤 온 것 같아요.” 중국계가 주도하는 위안부정의연대는 결의안 통과 한달 전에 결성됐다. 한국계인 그가 어떻게 ‘핵심 브레인’이 됐을까? “여러 단체가 기림비를 세우기 위해 모였지만 모두 소속 단체의 다른 활동이 있었어요. 위안부 활동만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는 가주한미포럼이 유일했죠.”
10년간 위안부 싸움을 벌이며 축적한 경험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유용하게 쓰였다. 그는 2년 전 ‘기림비 결의안’ 통과 때를 회상했다. 일본 정부가 막후에서 반대 로비를 지원하면서 결의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그가 제안해 급하게 한국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모셔온 것이다. “이 할머니의 청문회 증언이 (결의안 통과에) 결정타였어요.”
그 증언 이후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 청문위원은 할머니에게 모욕을 주는 일본계 증인에게 세번 연달아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죠.” 그는 덧붙였다. “개방적인 미국 사회라 해도 성폭행 신고 비율이 10% 정도에 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로한 할머니가 고통을 참고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는 모습을 보고 (미국인들이) 완전히 허물어졌죠. 위안부 피해 여성이 40만명이라고 말만 해선 잘 와닿지 않아요. 할머니들이 수요시위 투쟁을 하고 미국에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 여론이) 확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샌프란시스코 ‘기림비’ 제막
미국 내 7번째·대도시에선 처음
‘20개 다인종’ 위안부정의연대 주도
2015년 시의회 ‘기림비 결의안’
일본계 거센 로비 공세 맞설 때
“10년간 위안부 투쟁 경험 큰 도움”
올해 설립 10돌을 맞은 가주한미포럼은 김 국장이 위안부 싸움을 시작하면서 만들었다. 회원은 그를 포함해 6명뿐이다. 사무실도 따로 없다. 설립 목적은 오로지 한가지, ‘위안부 문제 해결’이다. 2007년 미 연방하원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HR) 121을 통과시켰다. 김 국장은 당시 이 결의안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캘리포니아 지역 한인 태스크포스의 일원이었다.
전남 광주에서 태어난 그는 대학을 다니던 21살 때 가족이민으로 미국에 왔다고 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민속음악과를 졸업한 뒤 법정 통역사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도 땄다. “어머니가 좋은 직업이라고 법정 통역사를 권했죠. 시험은 쉽지 않았어요. 그때 100명이 지원해 저 혼자 합격했거든요.”
왜 위안부 싸움에 뛰어들었을까? “2007년 당시에 학생들과 풍물을 하는 우리문화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위안부 문제를 자세히는 몰랐어요. 그때 일본 정부가 위안부 존재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죠.”
포럼 등의 노력이 빛을 발해 2013년 글렌데일시에 서부 최초로 위안부 기림비가 들어섰다. 그러자 이듬해 일본계 극우 인사가 일본 정부의 금력을 등에 업고 시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냈다. 연방대법원은 올 초 기각 결정으로 시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쪽은 자치정부가 외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김 국장은 시의 소송전을 돕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시들리오스틴)의 공익 무료변론 지원까지 성사시켰다. “원고 쪽에서 대형 로펌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저와 업무 관계에 있는 시들리오스틴 쪽에 무료변론 요청을 했죠. 그쪽 수석변호사 중 표현의 자유 권위자가 있어 큰 도움을 받았어요.”

포럼은 지금 캘리포니아주 세계사 교사들의 수업지도안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는 10학년생들이 세계사를 배울 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이 포함되도록 공립학교 역사-사회과학 교육과정 지침을 개정했다. “지침이 있어도 선생님이 안 가르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지도안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릴 생각입니다. 교사 워크숍에 가서 홍보도 하고요.”
포럼은 오는 30일 연례모금 행사를 한다. “300~400명 정도가 후원을 해줍니다. 이 돈은 주로 교통비로 써요. 나머지는 회원들 사비로 충당하죠. 이번 행사엔 150~200명 정도 참석할 것 같아요. 요즘은 중국계가 많이 옵니다.”
그가 사는 글렌데일엔 인종학살의 뼈아픈 기억이 있는 아르메니아계 이민자가 많이 살고 있다. “아르메니아계인들은 위안부 문제를 너무 잘 이해합니다. 터키가 아르메니아 인종학살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아르메니아계가 지역 정치권에 많아 영향력이 있어요.” 일본계 이민자들도 ‘국가 차원의 인권침해는 국가가 사죄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는 편이라고 했다.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일본인들이 강제수용당한 경험이 있어요. 일본계가 1980년대 국가배상운동을 펼쳐 연방의회의 공식 사과와 1인당 2만불 배상을 받기도 했죠.”
그는 “위안부 문제는 전시 여성 성폭력으로, 인권 문제이자 반인륜 범죄”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보나 정치, 외교 문제와 엮으면 안 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해 일본과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일본 쪽의 철저한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강성만 선임기자 sungman@hani.co.kr, 사진 김현정 국장 제공

![‘민주주의가 승리했다’…환한 표정의 시민들 [포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05/53_17438487254069_20250405500636.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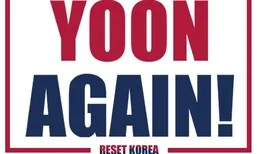


![[분석] 트럼프 ‘관세폭탄’, 재무장관 따돌리고 결정…미 증시 ‘박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06/53_17439029780005_20250406500556.webp)
![기후위기에도 감세 정책만 내놓는 대선 잠룡들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02/53_17435897402671_20250402503665.webp)

![한국 유일 \'여성 빙하학자\' …자연이 묻어둔 \'냉동 타임캡슐\'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328/53_17431240933742_20250327504802.webp)



![[사설]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 이래도 김건희 봐줄 건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03/53_17436725142274_20250403503835.webp)





![[단독] 교제폭력 피해자가 살인자로…31번 신고에도 보호받지 못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04/53_17437212560116_20250403504325.webp)








![검찰독재정권 2022.05.10~2025.04.04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04/53_17437558978226_20250404503237.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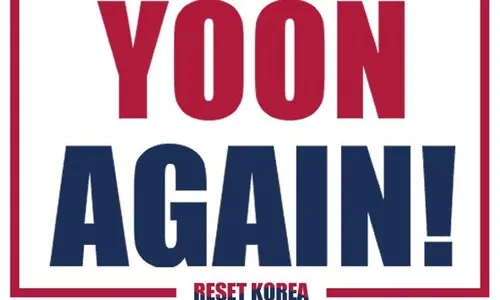





![트럼프 ‘관세폭탄’, 재무장관 따돌리고 결정…미 증시 ‘박살’ <font color="#00b8b1">[분석]</fon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06/53_17439029780005_20250406500556.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