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후 2019 아시아미래포럼 첫날의 마지막 세션은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의 ‘수사(레토릭)를 넘어: 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경제, 사회, 환경적 전환의 진전은 느려졌는가’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발제로 시작됐다. 이 국장은 “불평등 원인에 대한 수많은 분석이 있었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효과적인 정책과 행동 변화가 없었다. 전 세계 노동자 상위 10%가 전체의 49%를 가져가지만 하위 50%의 몫은 6%에 불과하다”며 더는 ‘수사’가 아닌 ‘행동’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평등 완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뭘까. 정부는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첨단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지만,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기술 투자에는 인색하다. 어떤 기술이냐에 따른 편향이 있다는 이야기다. 또 △주류 경제학에 대한 대안 경제담론의 대중적 설득력이 약하고 △조세·반독점·환경정책에서 국제적 공조가 어려워졌으며 △엘리트층의 배제적인 교육 투자로 계층화가 더욱 공고해지는 현실 등을 짚었다. 결국 해결은 ‘정치의 몫’이었다. 다만 막연히 국가에 요청하기 이전에 사회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세대 간, 노동자 간 격차로 새로운 정치동맹의 결성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이 국장은 덧붙였다.
이날 토론의 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 전환은 결국 정치가 하는 일”이라며 “지난달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라는 16살 소녀가 우리 시대 기성세대에 대해 ‘우리를 실패시키고 있다, 좌절시키고 있다’는 준엄한 질문을 던졌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실천적 노력을 위해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지방정부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 수는 없는 만큼, 노동 존중 도시로서 서울시가 생활임금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경선 루트임팩트 최고상상책임자(CIO)는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을 돕는 활동 등을 소개하며 체인지 메이커들이 사회 구성원 전체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원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서울 성동구청장)은 “신기술 문제는 분배와 관련된 정치·경제 문제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일자리가 양극화하는 상황에서 중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 깊숙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 새 산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을 지원해 재취업과 창업을 돕는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로버트 페이지 영국 버밍엄대학교 교수는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 합치하는 그런 뉴스만 접하고자 한다. 읽는 매체만 계속 읽고 이에 따라 실제 사실이 무엇인지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은데, 기후변화 대응, 기본소득 등도 그렇다”며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감대 마련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노나카 도모요 로마클럽 집행위원은 “모든 나라가 기후변화라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개개인들이 행동을 취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일상에서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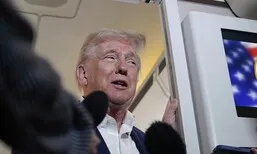













![[포토] “의선이형, 그린철강에 투자하세요”](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11/53_17443356481814_20250411501176.webp)

![기후위기에도 감세 정책만 내놓는 대선 잠룡들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02/53_17435897402671_20250402503665.webp)







![검찰독재정권 2022.05.10~2025.04.04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04/53_17437558978226_20250404503237.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잠결에 했을 수도” “한부모라”…함상훈의 아동성범죄 감형 사유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634/380/imgdb/child/2025/0413/53_17445115513887_20250408503854.webp)






